채근담(菜根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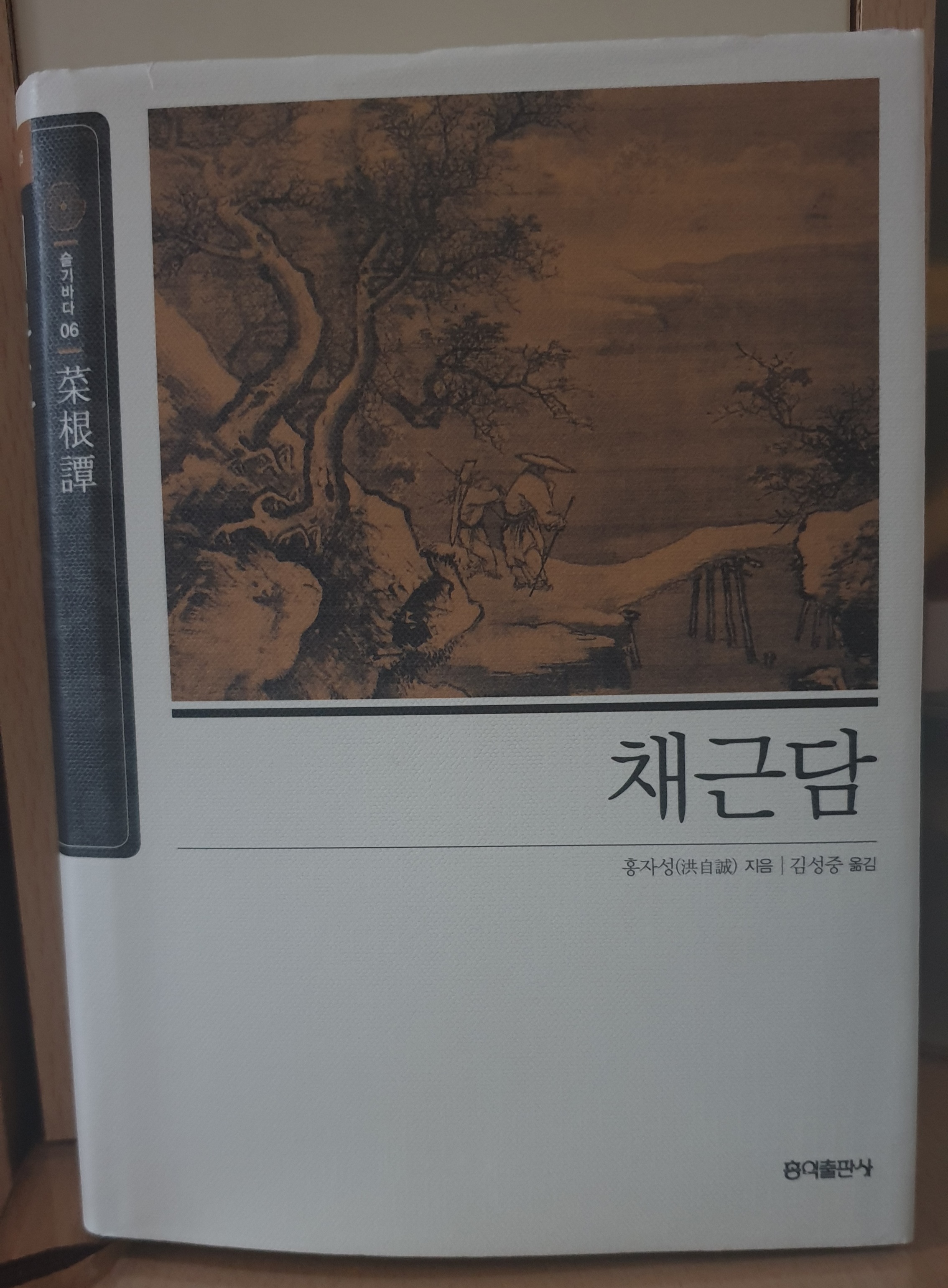
잠언 / 자기 수양 / 치우치지 않는 것
홍익 출판사의 『채근담(菜根談/홍자성 저/김성중 역)』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기본 정보
저자
사적
『선불기종』(1602), 『채근담』(1607-1613)
저술 배경
중국 명나라는 황제의 권력이 강하고 지식인이 소외받는 사회 구조로, 도교와 불교에 대한 존중이 강했다. 이에 유학자들은 세상을 교화하기보다 현실세계를 떠나 학문을 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용
자신을 수양하여 현실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원만하게 행동하라는 주제가 담긴 책
판본
- 만력4연간에 간행된 판본
- 저자가 홍자성이며 우공겸의 제사(題詞)5가 붙어 있는 판본
-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나뉘어 있으며 장수가 360장 미만
- 본 역서는 이 판본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판본을 대조하여 적절하게 취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건륭6연간에 간행된 판본
- 항목이 수성(修省)·응수(應酬)·평의(評議)·한적(閑適)·개론(槪論) 등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개론의 내용이 만력연간 간행본에 있음
- 만력연간 간행본에 비해 장수가 많음
후기
귀에 거슬리는 충고더라도 항상 들을 줄 알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더라도 항상 간직한다면, 이것으로 덕을 증진시키고 행동을 닦는 숫돌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들리는 말마다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마다 자신의 마음에만 맞게 잘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일생을 짐새의 독 속에 파묻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실한 마음과 온화한 기색, 즐거운 얼굴빛과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형제를 한 몸처럼 융화시키고, 뜻과 기개를 통하게 한다면, 호흡을 고르거나 마음을 관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경청, 양보, 온화, 맞춤형 지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덕목이지만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하나씩 읽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과도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으며, 읽고 배우면 현실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씀은 훌륭한 덕행이나, 과도하게 있는 힘을 다하면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할 수 없다.
담박한 삶은 고매한 풍격이나, 지나치게 인정이 메마르면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가 그 책망을 감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저 글자나 베껴 쓰는 하인밖에 되지 못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리의 허울을 쓴 도적일 뿐이다.
학문을 연마하면서도 실천을 중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빈말이 될 뿐이고 업적을 세우고도 은덕 베풀 것을 생각지 않으면 눈앞에서 잠깐 피었다 시들어 버리는 꽃이 될 뿐이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만이 즐거운 줄 알고 명예와 지위가 없는 가운데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운 것만이 근심인 줄 알고 굶주림도 추위도 없는 가운데 더 큰 근심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하염없이 망상에 빠지는 것은 이미 이룩한 일을 잘 지켜 지속해 나아가는 것만 못하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미리 대비하는 것만 못하다.
성급하게 서둘러서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던 일이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의외로 쉽게 자명해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쉽게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소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
전집이 치우치지 않는 생활 속 처세와 마음의 고요함을 이야기했다면 후집은 대자연 속 초탈한 마음의 경지에 다다른 은자를 강조하여 글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운문에 대구 형식으로 쉽게 쓰여 있어 읽기 쉽고 전집의 경우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차분해지고 스스로의 중심에 대해 생각하며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책이다.
이름. 부모나 스승 등 어른이 지어주는 것 ↩︎
옛날에 15세-20세가 되면 혼인 전 관례(冠禮, 성년식)를 치르고 가지는 호칭. 『예기(禮記)』의 “이름(名)을 귀하게 여겨서 공경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에 따라 이름(名)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자(子)를 불렀다. 명(名)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스승 등 어른이 지어주었다. ↩︎
살아가면서 뜻한 바가 있거나 마음이 가는 의미에 따라 스스로 짓거나 다른 사람이 지어준 호칭. ↩︎
萬歷. 1573-1619. 중국 명나라 말기 신종(神宗) 황제 재위 기간 당시의 연호 ↩︎
책의 첫머리에 그 책과 관계되는 노래나 시 따위를 적은 글 ↩︎
乾隆. 1736-1796. 중국 청나라 고종 황제 재위 기간 당시의 연호 ↩︎